ì 7ì°š ì€ë± 곌í êµê³Œì íí ììì STS(곌í-êž°ì -ì¬í) ëŽì© ë¶ì
- 1. ì 7ì°š ì€ë± 곌í êµê³Œì íí ììì ì 7ì°š 곌í êµê³Œì íí ììì STS(곌í-êž°ì -ì¬í) ëŽì© ë¶ì STS(곌í-êž°ì -ì¬í) ë¶ì íì¬ì †ìŽíìž â€ ì°šì íž â€ ë žíí¬ (ììžëíêµ)
- 2. â ìë¡ â£ ì°êµ¬ì íìì± â¢ ê³Œí †Ʞì ì ììì ê°ì¶ ì믌ì ìì±íêž° ìíŽìë STS êµì¡ìŽ ì§ ììŽë íìµ êž°ë¥ë¿ ìëëŒ ì¬ê³ ë ê°ì¹ ë°ë¬ìë êŽì¬íŽìŒ íš(Bybee et al., 1986). ⢠ìŽìê°ì STS êµì¡ì íìì±ìŽ êµëŽìžì ìŒë¡ ëëëë©Žì(êµì¡ë¶, 1994, 1997; NSTA, 1991), êµì¬ë€ì STS êµì¡ì ì€ìì ëíŽ êžì ì ìž íë륌 볎ìŽê³ ììŒë, ì€ë± êµì¡ê³Œì ëŽì STS ëŽì©ì ë°ì ì ëë ë®ë€ê³ ìžìíê³ ìì(ìµê²œí¬, 1994). STS êŽë š êµì¡ê³Œì 목íì ì€ì ìì ì ë°ì ì ë륌 íëšíêž° ìíŽ ìë êµì¬ë€ìŽ êµì-íìµìì ì£Œë¡ íì©íë êµê³Œì(ìµê²œí¬ì ê¹ì ì§, 1996; Chiang-Soong & Yager, 1993)륌 ë¶ìí íìê° ìì.
- 3. ⢠ì í ì°êµ¬ìì 6ì°š ì€íêµ ê³Œí êµê³Œì(ìµê²œí¬, 1997)ì ì€íêµ íí ëšì(ê¹ì€í¬ ë±, 1999)곌 ê³ ë±íêµ ê³µíµê³Œíì íí ëšì(ìµìžì ë±, 2001)ì ë¶ìí ì¬ë¡ê° ììŒë, STSì ì€ìí ìì ì€ì íëìž ê° ì¹ë ì€íì ìž¡ë©Žì ê°ê³ŒëìŽ ìì. 7ì°š ì€ë± êµê³Œì륌 ë¶ìí ì¬ë¡ë ê±°ì ììŒë©° í¹í, ì§ììŽë êž°ë¥ ë¿ ìëëŒ ê°ì¹ë ì€í ììê¹ì§ íì¥íì¬ ë¶ìí ì°êµ¬ê° ìŽë£šìŽì§ ì§ ìê³ ìì. â ¡ ì°êµ¬ ëŽì© ë° ë°©ë² â£ ì°êµ¬ ëì ⢠7ì°š ì€ë± 곌í êµê³Œì ìŽ 25ê¶ì íí êŽë š 10ê° ëšì
- 4. ⣠ë¶ì êž°ì€ 1) Yager(1984, 1989)ì âSTS êµì¡ 곌ì ì íì êµ¬ì± ììâ â ì§ìì¬íìì êŽë šì± ⡠곌íì ìì© â¢ ì¬íì 묞ì ⣠ìì¬ê²°ì ë¥ë ¥ íšìì ìí ì°ìµ †곌í곌 êŽë šë ì§ì ì ëí ìžì ⥠ì€ì 묞ì ì ëí íë ìì ⊠곌íì ë€ì°šìì± â§ ì 볎 íë곌 ìŽì©ì êŽí íê°. 2) Cheek(1992)ì âSTS êµì¡ì ëí ì§ì¹šê³Œ êµì¡ 곌ì 구조ì ë¹êµâ ⢠ì ì ë STSëŽì©ì âì§ì/êž°ë¥/ê°ì¹/ì€íâì 4ê° ìììŒë¡ ëëëë° í¹í, ê°ì¹ë ì€í ììì í¬íšíëë° ì믞륌 ëê³ ë¶ì êž°ì€ìŒë¡ ì ííš.
- 5. ⢠Cheek(1992)ì ë¶ì êž°ì€ K1. 곌í, êž°ì , ì¬íì ìížìì© ë¬ì¬ S1. STS묞ì ì ëí ìì¬ìíµ êž°ë¥ K2. 곌í곌 êž°ì ì íê³ì ëí ìŽíŽ S2. â곌íâìŽë ìžì§ 곌ì êž°ë¥ K3. êž°ì ì ìž ë°ì 곌 곌íì ìž ë°ì ì êµ¬ë³ S3. ìì¬ê²°ì 곌 묞ì íŽê²° êž°ë¥ K4. íí STS 묞ì 륌 ìžì S4. ë¹íì ì¬ê³ êž°ë¥ êž°ë¥ K5. ì ìžê³ì ìížìì¡Žì±ì ëí ìžì S5. ì§ëš íëì ì§í êž°ë¥ K6. ì€ìí STSê°ë ìŽíŽ S6. ì§ëš íëììì ì§ëë ¥ K7. 곌íì ìž ìŠê±°ì ê°ìžì ì견ì êµ¬ë³ S7. ìì¬ ë늜 ì ì²ëŠ¬ì íì ì§ì K8. êž°ì ì ìì©ì êŽí ìŽíŽ S8. ì€ì ìí©ììì êž°ì ì ì© K9. ì ëí êž°ì ë€ì ì ííê² ì¬ì© ê°ë¥ V1. ìžê³, 곌í, êž°ì ì ëí ì¬ë¯žì ê°ì K10. STS묞ì ì íŽê²°ì± ì ëí íëšë ¥ V2. 믌죌죌ìì 믌죌ì ì ì°šì ëí ê°ì¹ ì€ëŠ¬ì K11. STS묞ì ì ì§ìì±ì ëí ìžì V3. ê°ì¹ì ì€ìì±ì ëí ìŽíŽ ê°ì¹ K12. 곌í곌 êž°ì ì ëí ì¬ííìŽë ì² íì V4. ê°ìžì ìž ê°ì¹ì ëí íí ê°ë¥ ëí ìŽíŽ V5. 죌ìŽì§ STS묞ì ì êŽë šë ê°ì¹ë€ì ìë³ K13. í구ì ë³žì§ A1. ì°êµ¬ ìí ì€í K14. ì¬íì ìíŽ ì¡°ì ëë 곌í곌 êž°ì A2. ì§ì ì¬íë ì¬í ìŒë°ìì STS묞ì 륌 ì€í
- 6. ⣠ë¶ì ë°©ë² â¢ 7ì°š 곌í êµê³Œìë êž ì죌ì 6ì°šì ë¬ëŠ¬ ìê° ìë£ê° íë¶íê³ ëŽì©ì ížì§ìŽ ë€ìíê³ ë³µì¡í ë¯ë¡, ì€ ëšì ëì ë©Žì ëšìë¡ ê³ì°íì¬ ë°±ë¶ ìšì ì ìíš. ë©Žì ìž¡ì ìë í¬ëª ëêžì§ ìŽì©. ⢠ëŽì©ì 구ë¶ì ìíŽ ì í ì°êµ¬(ê¶ê²œì€, 1996)ì ë°©ë²ì ì°žê³ íì¬ ëªš ë ë¶ì ëìì ëšëœì êž°ì€ìŒë¡ íììŒë©°, ìì í 1ëšëœì 1ê°ì§ ì믞ë§ì ê°ëë€ê³ ê°ì . ⢠1ëšëœì ìë¯žê° Cheek(1992)ì ë¶ì êž°ì€ìì ì§ì, êž°ë¥, ê°ì¹, ì€ í ì€ ë ê°ì§ ìŽìì ììì 걞ì³ìë€ë©Ž ìëì ìŒë¡ ë¹ëìê° ìì ììì í¬íšìíŽ. ⢠ì°êµ¬ì 2ìžì ë¶ììê° ìŒì¹ë: 95% ìŽì
- 7. â ¢ ì°êµ¬ 결곌 1. STS ëŽì©ì í¬íš ì ë ⢠ì€íêµ íí ëšìì í¬íšë STS ëŽì©ì ë¹ìš: íê· 8.2% 6ì°š ì€íêµ íí ëšì: 5.4%(ìµê²œí¬, 1997); ê°ì ë êµê³Œìë ë€ë¥ž ì°êµ¬ìë¡ ìží ì°šìŽë¥Œ ê³ ë €í 결곌ë ìë. ⢠STS ëŽì©ì ë©Žì (%) íë 7 8 9 10 ì§ìì¬íìì êŽë šì± .0 3.0 .1 8.2 곌íì ìì© 88.7 73.9 16.6 30.8 ì¬íì 묞ì 7.4 18.8 1.8 27.9 ìì¬ê²°ì ë¥ë ¥ íšìì ìí ì°ìµ 0.5 .0 .0 1.7 곌í곌 êŽë šë ì§ì ì ëí ìžì 2.5 .2 .4 9.1 ì€ì 묞ì ì ëí íë ìì .0 .1 .0 1.5 곌íì ë€ì°šìì± .9 1.0 79.5 14.5 ì 볎 íë곌 ìŽì©ì êŽí íê° .0 2.8 1.6 6.4 ê³(STS ë©Žì ) 100.0 99.8 100.0 100.1 ì 첎 ë©Žì ì€ STS ë©Žì 2.9 8.5 12.3 5.7
- 8. ⢠ì€íêµë íë ìŽ ì¬ëŒê°ìë¡ STS íê· ë¹ìšìŽ ìŠê°. 6ì°š êµê³Œììì STS ëŽì©ì ë¹ìšìŽ íë ìŽ ì¬ëŒê°ìë¡ ìŠê°í ê²(ìµ ê²œí¬, 1997)곌 ì ì¬. ⢠â곌íì ìì©âì 44.0%(ì€íêµ íê· )â30.8%(ê³ ë±íêµ 1íë )ë¡ ê° ì, âì¬íì 묞ì âë 8.3%(ì€íêµ íê· )â 27.9%(ê³ ë±íêµ 1íë )ë¡ ìŠê°. ì€íììê²ë ì¬íì ìž ë Œì거늬ê°, ê³ ë±íììê²ë 곌í ì§ì곌 곌í êž°ì ì ìì© ì¬ë¡ê° STS ìì 죌ì ë¡ì íšê³Œì (ìµê²œí¬ì ì¡° í¬í, 2003). ⢠6ì°šì ë¹íŽ(ìµê²œí¬, 1997), 7ì°šììë âìì¬ ê²°ì (0.1%)â, â곌í êŽë š ì§ì (0.6%)â, â묞ì íŽê²°(0.1%)â, â곌íì ë€ì°šìì±(44.1%)â, âì 볎 íë íê°(1.8%)ì ë¹ìšìŽ í¬ê² ìŠê°. 7ì°š êµê³Œìê° 8ê°ì§ í목ì ê³ ë£š í¬íšíê³ ìë€ë ì¬ì€ì ê³ ë¬Žì .
- 9. 2. ê°ì¹ì ì€í ììì ê³ ë €í STS ëŽì©ì ë¶ë¥ ⢠STS ëŽì©ì ì§ì/êž°ë¥/ê°ì¹/ì€í ììë³ ë¶ë¥(%) íë ì§ì êž°ë¥ ê°ì¹ ì€í ê³ 7 88.0 8.6 1.9 1.5 100.0 8 91.1 8.3 .3 .3 100.0 9 97.6 2.0 .4 .0 100.0 10 91.2 7.9 .9 .0 100.0 ⢠ì§ì ìììŽ ìë±í ë§ê³ êž°ë¥, ê°ì¹, ì€í ììŒë¡ ê°ì. íë ì ë°ë¥ž ìŒêŽë 겜í¥ìŽ 볎ìŽì§ ììŒë©°, ê°ì¹ ìì곌 ì€í ìì ì ë¹ìšìŽ ë§€ì° ììŒë¯ë¡ íë ì ë°ë¥ž ì¶ìžë¥Œ ì°Ÿêž°ê° ìŽë €ì.
- 10. ⢠ì§ì/êž°ë¥ ììì 구첎í(%) íë 7 8 9 10 K1 2.5 .3 2.4 17.4 K2 .0 .0 0.3 .0 K3 .0 .0 .0 .0 K4 3.7 15.1 1.8 34.7 K5 .0 .0 .0 .0 K6 .0 .0 .0 .0 K7 .0 .0 .0 .0 ì§ì K8 80.1 75.2 16.9 32.1 K9 .0 .0 .0 .0 K10 .0 .0 .0 .0 K11 .0 .0 .0 .0 K12 .9 .0 76.2 6.5 K13 .0 .0 .0 .0 K14 0.8 0.5 .0 0.5 ê³ 88.0 91.1 97.6 91.2 S1 .0 4.2 0.5 2.0 S2 8.6 3.9 1.2 3.9 S3 .0 0.1 .0 2.0 S4 .0 .0 0.3 .0 êž°ë¥ S5 .0 .0 .0 .0 S6 .0 .0 .0 .0 S7 .0 .0 .0 .0 S8 .0 .0 .0 .0 ê³ 8.6 8.2 2.0 7.9
- 11. ⢠ì€íêµ 1íë ; K8ì ë¹ìšìŽ ê°ì¥ ëì. âìíë³íì ìëì§â ëšììì ìŽêž°êµ¬, ëì¥ê³ , ìŠêž° êž°êŽ ë±ì ì 늬륌 ë§ìŽ ë€ë£ž. ⢠ì€íêµ 2íë ; ì€íêµ 1íë ë³Žë€ K4ì ë¹ìšìŽ ëìŽëš. âíŒí©ë¬Œì ë¶ëŠ¬â ëšììì ëí í ì€íž, ìì ì ë¶ëŠ¬, ì¬íì© ë¶ëŠ¬ ìê±°, ì ì¡°ì ì êž°ëŠ ì ì¶, ì§ì ììë ì¬ì ì ë±ì STS ìì¬ë¥Œ ë§ìŽ ë€ë£šêž° ë묞. ⢠ì€íêµ 3íë ; K12ì ë¹ìšìŽ ìŠê°íê³ , êž°ë¥ ììì ë¹ìšìŽ ê°ì. 7ì°š 곌í êµê³Œìì 곌íì¬ êŽë š ëŽì©ìŽ ëê±° ëì ëììŒë ì£Œë¡ ë¬Œì§êŽì ë³íì ëí ëŽì©ì ì¹ì€íšìŒë¡ìš ë€ìí íì íëì ìì°ì€ëœê² ì°ê²°ëì§ ëª»íš. êž°ë¥ ììì ë¹ìš 2.0% ì€ìì S2ê° 1.2%륌 ì°šì§íš; 곌íì¬ êŽë š ëŽì©ì ìŒë°ì ìž ê³ŒíìŽë í¹ì 곌íìê° ëìì ìŽë»ê² ë°ê²¬íì ëì§ì ë§ì¶° ì§ì íš.
- 12. ⢠ê°ì¹/ì€í ììì ì ì ë¹ë íë 7 8 9 10 V1 2 V2 V3 1 ì€ëŠ¬ì ê°ì¹ V4 2 1 V5 2 1 2 ê³ 3 1 4 3 A1 ì€í A2 2 2 ê³ 2 2 0 0 ⢠ê°ì¹ ìì(0.3~1.9%)곌 ì€í ìì(0.0~1.5%)ì ë¹ìšë¿ ìëëŒ ë¹ë ìë ìì. ⢠ê°ì¹ë ì€í ììì êž°ë¥ ììì ëŽì©ê³Œ ì°ê²°ëš; ììžì ìŒë¡ ë êµê³Œ ì(ì€íêµ 1íë )ì ê²œì° ê°ì¹ë ì€í ììì ììŒë êž°ë¥ ììì íŽ ë¹íë ëŽì©ìŽ ìì.
- 13. STS ëŽì©ì 볞묞볎ë€ë ì€ëª ì죌ì ìœêž° ìë£ìì ë€ë£žìŒë¡ìš ë€ ìí íëìŽ ê³ ë €ëì§ ìì. ìì) âìŽì ê°ìŽ ì룚믞ë ìºìŽë ì ëŠ¬ë³ ëë ííž ë³ ë±ì ë ¹ì¬ ë€ì ì°ë ì¬íì©ì ë¹ì©ì ì€ìŒ ì ìì ë¿ë§ ìëëŒ ììì ì ìœíê³ í겜ì 볎ížíë€ë ë©Žìì ë§€ì° ì€ìí ìŒìŽë€â. ⢠ê°ì¹ ììììë STS êŽë š ê°ì¹ë¥Œ ìë³íë ê²ë¿ ìëëŒ, 곌íìŽë êž°ì ì ëí ì¬ë¯žì ê°ì¹ë ê°ìžì ê°ì¹ë¥Œ íííë ëŽì©ë ë€ë£ž. ì¬íì 묞ì ì ë Œì거늬륌 íì©íì¬ ì³ê³ ê·žëŠì ê°ëŠ¬ë ì€ëŠ¬ì ê°ì¹ì ëí ëŽì©ì ì ì. â £ ê²°ë¡ ë° ì ìž â 7ì°š êµê³Œìë 6ì°šì ë¹íŽ Yagerì 8ê°ì§ í목ì ê³ ë£š í¬íš. â íë ìŽ ì¬ëŒê°ìë¡ â곌íì ìì©âì ê°ìíê³ , âì¬íì 묞ì âë ìŠê°.
- 14. ì€íììê²ë ì¬íì ìž ë Œì거늬ê°, ê³ ë±íììê²ë 곌í ì§ì곌 êž°ì ì ìì© ì¬ë¡ê° STS ìì 죌ì ë¡ì íšê³Œì ìŽë¯ë¡ (ìµê²œí¬ì ì¡°í¬í, 2003) íë ì ë°ëŒ ì ì í STS 죌ì ì ì 곌 ë¹ìšì êŽí ì¬ ë Œìí íìê° ìì. â ê°ì¹ ìì곌 ì€í ììì ë¹ìšê³Œ ë¹ëìê° ë§€ì° ììŒë©° STS ëŽì©ìŽ 볞묞볎ë€ë ì€ëª ì죌ì ìœêž° ìë£ìì ë€ë£šìŽì§ë 겜ì°ê° ë§ì . ê°ì¹ë¥Œ ëª ë£ííê±°ë ê°ì¹ë¥Œ ì§ì곌 êŽë šì§ê² ëë ìì¬ ê²°ì ìŽë 묞ì íŽê²°(ì ìì곌 ê¹ìì, 2001)ê°ì êž°ë¥ ììì íëì ì ê·¹ ë°ìíì¬ ê°ì¹ ìììŽë ì€í ììê¹ì§ íì¥í ì ìë ì¬ì§ë¥Œ ë§ ë€ íìê° ìì. â êµê³Œììì ì§ì, êž°ë¥, ê°ì¹, ì€í ììì ê°ê° ìŽë ì ëì ë¹ì€ìŒ ë¡ ìŽë»ê² ì¡°ì§í ê²ìžê°ì ëí íì ì°êµ¬ê° íì. â íí ëšì ëŽì ë€ìí ì€ëŠ¬ êŽë š êµì íìµ ìì¬ë€(ì ë€ì€ìœíêµì ìí, 2001)ì ì ì í êµì¡ ìë£ë¥Œ ê°ë°í íìì±ìŽ ì êž°ëš.
- 15. â € ì°žê³ ë¬ží ì ë€ì€ìœíêµììí(2001). ê°ì¹ë¥Œ ê¿êŸžë 곌í. ììž: ë¹ë. êµì¡ë¶(1994). ì€íêµ ê³Œí곌 êµì¡ 곌ì íŽì€. ììž: ëíêµê³Œì. êµì¡ë¶(1997). 곌í곌 êµì¡ 곌ì . ììž: ëíêµê³Œì. ê¶ê²œì€(1996). ê³ ë±íêµ ì묌 êµê³Œìì 곌íì ììì êŽí ìì ë¶ì. ììžëíêµ ë°ì¬íì ë Œë¬ž. ê¹ì€í¬, ê¶íšì§, 묞ì±ë°°(1999). ì 6ì°š êµì¡ê³Œì ì ë°ë¥ž ì€íêµ ê³Œí êµê³Œì(ííëšì)ì STS ëŽì© ë¶ì. ëííííì§, 43(3), 321-327. ì ìì, ê¹ìì(2001). ê°ì¹ í구 몚íì ìí ì묌 ìì 몚íì ì ì©. íêµê³Œíêµì¡ííì§, 21(1), 160-173. ìµê²œí¬(1994). 곌íêµì¡ê³Œ STSì êŽí ì€ë± 곌íêµì¬ë€ì ìžì ì¡°ì¬. íêµê³Œíêµì¡ííì§, 14(2), 192-198. ìµê²œí¬(1997). ì€íêµ ê³Œí êµê³Œìì í¬íšë 곌í-êž°ì -ì¬í(STS) ëŽì©, íë ì í ë° í¬íš ì ë ë¶ì. íêµê³Œíêµì¡ííì§, 17(4), 425-433. ìµê²œí¬, ê¹ìì§(1996). 곌í êµê³Œì ì ì 곌 íê°ì êŽë šë êµì¬ë€ì ìžìì¡°ì¬ì 곌í êµì¬ íê° í ê°ë°ì êŽí ì°êµ¬. íêµê³Œíêµì¡ ííì§, 16(3), 303-313. ìµê²œí¬, ì¡°í¬í(2003). 곌íì ì€ëŠ¬ì í¹ì± êµì-íìµ ë°©ë². íêµê³Œíêµì¡ííì§, 23(2), 131-143. ìµìžì, ê¹ì€í¬, ìŽìí¬, 묞ì±ë°°(2001). ê³µíµê³Œí êµê³Œìì ííììì STS ëŽì© ë¶ì, ëííííì§, 45(3), 256-263. Bybee, R. W., College, C. & Minnesota, N. (1986). The Sisyphean question in science education: what should the scientifically and technologically literate person know, value, and do-as a citizen?. In R. W. Bybee (ED.) Science/Technology/ Society: 1985 yearbook of the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. Washington, D.C.: NSTA. Cheek, D. W. (1992). Thinking constructively about science, technology, and society education. New York: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. Chiang-Soong, B. & Yager, R. E. (1993). The inclusion of STS material in the most frequently used secondary science textbooks in the U.S..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, 30(4), 339-349.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(1991). The NSTA position statement on science-technology-society(STS).: A new effort for providing appropriate science for all. Washington, D.C.: Author. Waks, L. J. (1987). A technological literacy credo. Bulletin of Science, Technology & Society, 7(1/2), 357-366. Yager, R. E. (1984). Toward new meaning for school science. Educational Leadership, 41(4), 12-18. Yager, R. E. (1989). A rationale for using personal relevance as a science curriculum focus in school.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, 89(2), 144-15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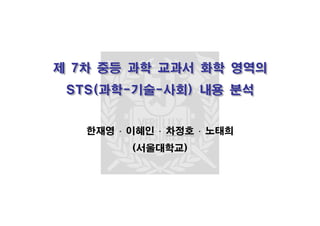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![[곌ì€ì° ì 93ì°š ì€íí¬ëŒ ë°ì ìë£]íë°ëë ì§ì§, íì°ìŒë¡ë¶í° ìì íê°?_ì°ìžë ì§êµ¬ìì€í
í곌 íí겜 êµì](https://cdn.slidesharecdn.com/ss_thumbnails/93-150716075601-lva1-app6891-thumbnail.jpg?width=560&fit=bounds)

















![1. [ìµì¢
] 믞ì¬êµ](https://cdn.slidesharecdn.com/ss_thumbnails/1-131220101708-phpapp02-thumbnail.jpg?width=560&fit=bounds)




![[ì 95ì°š ì€íí¬ëŒ ë°ì ìë£] ê³µíêµì¡ì ë°©í¥_ê³ ë €ë ê¹ì¢
ìœ íê³µìëª
ê³µí곌 êµì](https://cdn.slidesharecdn.com/ss_thumbnails/95-151106082348-lva1-app6891-thumbnail.jpg?width=560&fit=bounds)













